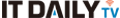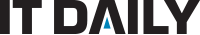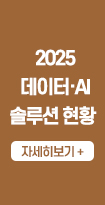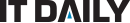프로젝트 수주에만 급급, 체계적이고 명확한 유지보수 규정 없어
SW 업계 관계자들은 "발주자와 공급자의 수직적 갑을 관계에 의한 불합리한 관행들이 고착화 되면서 비롯됐다"고 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발주자들이 SW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서 벌어진 현상이다.
그러나 좀 더 원론적으로 접근해보면 'SW전문기업'들이 유지보수 문제를 야기했다 할 수 있다.
프로젝트 수주 급급…유지보수 체계 없어
"국산 SW 시장은 SI 중심으로 이뤄져 패키지 보다는 고객이 요청한 사항을 맞춰주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SW업계 한 관계자의 말은 국내 SW 생태계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준다. 프로젝트 별로 SW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
또 대다수 국내 SW전문기업들은 자사의 유지보수 규정에 있음에도 프로젝트 별로 다른 형태의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단순이 프로젝트에 그치지 않는다. 추후 기술지원을 제공할 때 상이한 유지보수 계약조건이 많아지고 이에따라 체계화되지 못한 기술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국내 SW전문기업들이 글로벌 SW기업에 비해 장점을 내세운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오히려 SW전문기업들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미래 청사진은 그리기는 커녕 지금껏 눈앞에 있는 프로젝트 수주에만 급급했다"는 한 SW업체 대표자의 말은 SW업체들이 유지보수계약에 대해 신경을 기울일 여유조차 없음 말해준다.
SW전문기업들이 나서서 SW 판매 시 무상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 마치 서비스 하는 개념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것이다.
결국 유지보수에 대한 중요성을 당사자인 SW전문기업들마저 망각하고 있는 점에서 유지보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발주자와 SW 기업 간 유지보수 계약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발주자 쪽에서 요청한 계약서에 따라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이 계약 과정에서 유지보수범위를 명확하게 서술하지 않아 유지보수 범위를 벗어난 서비스 요청이 들어올 경우나 문제점이 발생해 추후 기술지원할 때에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SW전문기업체에서 실제 지원할 수 없는 범위인데도 발주자가 유지보수를 맺었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기술지원을 강요하기도 한다고 한다. 특히 구체적이지 않는 유지보수계약서로 인해 분쟁 시 발주자가 유리한 입장으로 해석하는 등 유지보수 계약을 두고 발주자와 SW기업 간의 마찰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발주자와 SW 기업 간 감정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SW 기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국내 SW 제품을 꺼리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품질 향상 및 신뢰성 확보가 관건
발주자들은 "국내 SW 제품을 쓰다가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기술지원을 어떻게 받나?"라는 질문을 자주 한다.
글로벌 SW 기업들의 탄탄한 재무구조와 달리 국내 SW전문기업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점에서 발주자들은 모험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기관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모 교수는 "국내 SW전문기업들은 최고경영자나 오너의 도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대부분 중소 SW 기업들의 지배 구조는 개인이나 가족 중심이기 때문에 오너 한 사람의 도덕적 해이로 일순간에 회사는 물론 솔루션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내 SW 기업들은 글로벌 SW 기업과 비교하면 부족한 점이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뢰성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프로젝트에 급급한 주먹구구식 제품 개발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로드맵 수립을 통한 제품 개발이 이뤄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
또한 제품 및 기업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이고 명확한 기술지원에 대한 규정 확립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유지보수 계약 체결 시 기업 환경에 맞춘 세분화된 기술지원 상품을 개발해 구두 및 별도의 계약이 아닌 SW 기업들이 제공하는 체계적인 기술지원 체계를 따를 수 있게 해야 한다.
결국 유지보수를 SW 제품 판매 시 부가적으로 따라가는 서비스 형태가 아닌 또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고 접근했을 때 유지보수에 대한 현실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관련기사
고수연 기자
going@it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