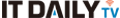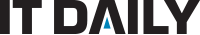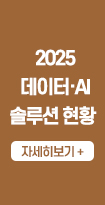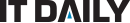[아이티데일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인공지능(AI) 인프라, 즉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 최전선에는 이 지역의 억만장자들이 이끄는 그룹이 포진해 있다. 인도의 무케시 암바니, 일본의 손정의 등이 대표적이다. 아태 지역의 AI 데이터센터 건설 현황을 포브스지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해 정리한다.
말레이시아 남부 조호르주 플라이 산자락, 팜오일 농장으로 둘러싸인 부지에는 창문 없는 단층 건물 네 동이 줄지어 서 있다. 그곳에서 24시간 끊임없이 울리는 낮은 진동음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AI 연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초강력 슈퍼컴퓨터들이 가동하며 나오는 소리다. 이 중에는 엔비디아(NVIDIA)의 최신형 GPU GB200을 탑재한 장비도 있다.
초당 1.8TB(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이 GPU들은 말레이시아 재벌 프랜시스 요가 이끄는 복합기업 YTL그룹의 전력 부문 계열사 YTL파워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20MW(메가와트)급 데이터센터에 설치돼 있다.
엔비디아는 2년 전 YTL과의 협력을 통해 조호르에 43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이 중 24억 달러는 이미 투입돼 20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센터 용량이 완성됐다. 그 규모는 당시 싱가포르 전체 데이터센터 용량에 맞먹는 시설이었고, YTL파워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그러나 YTL의 판단은 적중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디지털 허브’ 전략을 내세우면서, 넓은 토지와 풍부한 전력 및 수자원을 보유한 조호르주가 데이터센터 투자 핫스팟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YTL 데이터센터에서 북서쪽으로 약 28km 떨어진 세데낙 테크파크에서는 말레이시아 재벌 로버트 콕이 이끄는 K2스트래티직이 사업 확장을 추진 중이다. 향후 수년 내에 말레이시아의 데이터센터 용량을 현재의 4배인 240메가와트로 늘릴 계획이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2030년까지 말레이시아를 AI 선진국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들은 향후 5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2,400억 달러를 투자해 데이터센터 네트워크를 확장할 계획이다. 미국 부동산 컨설팅사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는 “2030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데이터센터 용량이 29기가와트(GW)를 넘을 것”이라며, 미주(32GW)에 이어 세계 2위 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도에서는 고탐 아다니가 이끄는 아다니 엔터프라이즈가 구글과 협력해 남동부 안드라프라데시 주에 인도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 캠퍼스를 건설 중이다. 투자 규모는 150억 달러에 달한다. 또 인도 최고 부호 무케시 암바니가 이끄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스는 구자라트 주에 1기가와트급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며, 구글 및 메타와 함께 AI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한국에서는 SK그룹이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협력해 울산에 50억 달러를 투입, 데이터센터를 건설한다. 또 오픈AI는 카카오와 제휴해 서울 북동부에 데이터센터를 건설 중이며, 삼성전자도 오픈AI용 메모리칩 개발과 병행해 국내 데이터센터 공동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국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반도체 메모리,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HBM) 분야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AI 연산 인프라 구축에서 유리한 입지에 있다. 엔비디아나 오픈AI가 국내 대기업과 협력하는 것도 이런 장점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
대만에서는 폭스콘과 엔비디아가 14억 달러를 투자해 100메가와트급 AI 데이터센터를 건설 중이다.
태국에서는 치라티왓 일가가 이끄는 센트럴 파타나가 미국 투자사 워버그피커스가 지원하는 에볼루션 데이터센터와 협력했다. 에너지 그룹 걸프 디벨롭먼트는 구글과 협력해 AI 클라우드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비.그림 파워는 디지털 에지와 협력해 10억 달러를 투자, 태국 전역에 AI 데이터센터를 세울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의 DCI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수도권의 119메가와트 데이터센터 용량을 1.9기가와트로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빈탄섬에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를 건설 중이다. 다른 인도네시아 재벌들도 진입 중이다. 시날 마스 그룹은 K2 스트래티직과 협력해 자카르타 인근에 데이터센터를 개발 중이며, 광산 재벌 트리프트라 그룹은 에스티 텔레미디어 글로벌 데이터센터와 협력해 첫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중국의 잭 마가 이끄는 알리바바는 530억 달러를 투자해 아시아, 유럽, 남미에서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 텐센트는 21개국에서 55개 시설을 운영하며 일본과 인도네시아에 신규 데이터센터를 건설 중이다. 티베트는 중국에서 데이터센터가 집중적으로 건설되는 곳이다. AI 데이터센터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2025년 6월 준공된 야장-1 AI 컴퓨팅센터가 가동 중이며, 라싸에 위치한 티베트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센터는 2026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다수의 데이터센터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오사카의 옛 샤프 LCD 공장을 60억 달러를 들여 400메가와트급 데이터센터로 개조 중이다. 또 미국의 오픈AI가 추진 중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도 출자 의사를 밝혔다.
데이터센터의 급팽창은 전력과 수자원 등 자원 인프라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YTL처럼 태양광 발전을 활용하거나, 삼성전자처럼 해상형 데이터센터 개발을 모색하는 기업도 있지만 막대한 에너지 소모는 큰 부담이 된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전력은 증가분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AI 데이터센터 과열이 ‘데이터센터 버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JLL의 아시아·태평양 데이터센터 조사 책임자 지테시 칼레칼은 포브스에서 “의료·교육·국방 등 핵심 분야에서 AI 활용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만큼, 당분간은 공급 부족이 더 큰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