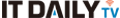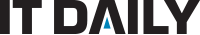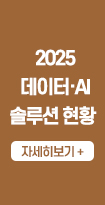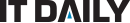[아이티데일리] 세계경제포럼(WEF)는 탄소를 가두는 콘크리트부터 사막 지역의 지속 가능한 담수화, 전력망에 전기를 되돌려주는 자동차까지, 기후 변화로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할 10가지 핵심 기술을 선정해 발표하고 그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또한 보고서 요약글도 게재했다. ‘지구 건강을 위한 10대 신흥 기술 솔루션(10 Emerging Technology Solutions for Planetary Health)’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WEF와 프런티어 재단이 공동으로 발간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WEF의 새 보고서는 가뭄·메탄 누출·해수면 상승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지구 환경 교란에 맞서 싸울 잠재력을 지닌 신흥 기술들의 물결을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는 안정적인 지구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식량·물·에너지·소재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과학이 어떻게 지구 건강을 지키고 파괴적인 인간 활동을 줄일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가 제시한 열 가지 혁신 기술 솔루션은 인류가 에너지를 공급하고 식량을 재배하며 담수를 확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보고서는 이들 기술 대부분이 이미 존재하지만,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2024년 전 세계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연중 내내 섭씨 1.5도 높았으며, 현 추세대로라면 2100년까지 3도 상승이라는 재앙적 시나리오에 가까워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피해 복구와 적응을 동시에 이끌 기술을 제시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확산할 방법까지 모색하고 있다. 지구를 건강하게 바꿀 10대 신흥 기술은 아래와 같다.
1. 정밀 발효 (Precision Fermentation)
축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15% 이상을 차지한다. 정밀 발효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이다. 이는 유전공학으로 설계된 미생물이 단백질·지방·효소를 직접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동물 없이도 우유 단백질, 달걀 단백질, 심지어 콜라겐까지 생산할 수 있다.
미국 퍼펙트데이는 이 기술로 ‘동물 없는 아이스크림’을 출시했고, 유럽에서는 식물성 식품 기업들이 잇달아 발효 기반 단백질로 전환 중이다. 보고서는 “정밀 발효는 식량 시스템을 탄소 중립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 첫 번째 현실적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2. 그린 암모니아 생산 (Green Ammonia Production)
비료 생산에 쓰이는 기존 암모니아 공정은 석탄·가스 의존형 하버-보슈(Haber-Bosch) 방식이다. 반면 그린 암모니아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만든 그린 수소를 이용해 암모니아를 합성한다. 그렇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 90% 줄이면서도, 청정 비료와 탄소 없는 선박 연료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덴마크 오스테드(Ørsted)와 일본 IHI는 이미 그린 암모니아 플랜트를 시범 운영 중이며, IMO(국제해사기구)는 2030년 이후 ‘암모니아 연료 선박’을 새로운 국제표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3. 자동화 식품폐기물 업사이클링 (Automated Food Waste Upcycling)
음식물 쓰레기는 인류가 배출되는 전체 온실가스의 10%를 차지한다. AI 기반 이미지 인식과 로봇 팔 기술은 이제 폐기물 속에서 식용 가능 부분을 식별하고, 포장재와 자동 분리할 수 있다. 그 결과물은 퇴비, 가축사료, 혹은 단백질 파우더와 바이오플라스틱 원료로 재탄생한다.
영국 투굿투고(Too Good To Go)는 소매 유통망의 잉여 식품을 자동 분류해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했고, 한국과 일본에서도 음식물-포장재 자동 분리 로봇이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다.
4. 메탄 포집 및 활용 (Methane Capture and Utilization)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84배나 강력한 온실가스지만, 대기중에 머무르는 수명이 이산화탄소보다 매우 짧고 조기 포집 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농장·매립지·석유·가스 시설 등에서 새는 메탄을 위성과 센서로 탐지해 포집 후 연료나 화학 원료로 전환한다.
미국 GHG샛은 지구 궤도 위에서 메탄 누출 지점을 실시간 추적하며, 인도와 덴마크는 농장형 바이오가스 시설로 이를 에너지화하고 있다.
5. 그린 콘크리트 (Green Concrete)
시멘트 산업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약 8%를 배출한다. ‘그린 콘크리트’는 산업 부산물(플라이애시, 슬래그 등)을 혼합하고,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를 화학적으로 고정해 콘크리트 안에 가둔다.
캐나다 카본큐어(CarbonCure)는 이러한 기술로 이미 500곳 이상의 건설 현장에 납품하고 있으며, ‘탄소를 저장하는 빌딩’이라는 개념은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6. 차세대 양방향 충전 (Next-Gen Bi-directional Charging)
전기차(EV)는 더 이상 전기의 ‘소비자’가 아니다. 양방향 충전(V2G, Vehicle-to-Grid) 시스템은 전기차 배터리의 남는 전기를 전력망에 되돌려주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피크타임 전력 수요를 조절한다.
닛산의 리프투홈(LEAF-to-Home) 시스템은 일본의 정전 사태 때 가정 전력의 80%를 EV로 공급했고, 미국 캘리포니아는 ‘차량-그리드 통합(VDGI)’을 공공 인프라로 추진 중이다.
7. 정밀 지구 관측 (Timely and Specific Earth Observation)
초고해상도 위성과 AI 기반 센서가 홍수, 산불, 가뭄, 삼림 벌채를 실시간 감시한다. 데이터는 정부·기업·시민단체에 즉시 전달되어 기후 위기 조기 대응 시스템을 가능케 한다.
유럽의 코페르니쿠스 프로그램은 산불 진화 및 수자원 관리에 이미 활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메탄샛은 글로벌 메탄 누출 추적을 전담한다. 기후 데이터가 곧 행동의 신호로 전환되고 있다.
8. 모듈형 지열에너지 (Modular Geothermal Energy)
지열 발전은 24시간 안정적이지만, 대규모 시설이 필요했다. 이제는 공장에서 미리 조립된 모듈형 시스템이 등장해 설치 기간과 비용을 대폭 줄인다. 소규모 커뮤니티나 산업단지도 자체 지열 발전이 가능하다.
미국 퍼보 에너지(Fervo Energy)는 수평 시추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지열 네트워크를 구축 중이며, 아이슬란드와 일본은 이미 도시 전력망에 통합 실험을 시작했다.
9. 재생형 담수화 (Regenerative Desalination)
지속 가능한 담수화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생존 과제다. ‘재생형 담수화’는 태양광과 고효율 나노막 기술을 결합해 에너지 소비를 기존의 20% 이하로 절감한다. 또한 폐수의 염분을 재활용하거나 자원화함으로써 ‘물 순환’까지 가능케 한다.
이탈리아·캐나다의 시범 플랜트는 중동형 모델로 확장 중이며, 사우디는 이 기술을 ‘국가 수자원 전략 2030’의 핵심 축으로 검토하고 있다.
10. 토양 건강 기술 융합 (Soil Health Technology Convergence)
토양은 당초 인류가 배출한 탄소의 약 5분의 1을 흡수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퇴화된 토양은 이제 탄소를 발생하는 ‘탄소원’으로 바뀌었다. 센서, 미생물 분석, AI를 결합한 토양 모니터링 시스템은 토양의 탄소 저장량과 수분, 생태 활력을 실시간으로 복원 관리한다.
미국 인디고 애그(Indigo Ag)와 호주의 리그로우(Regrow)는 ‘탄소 농업(Carbon Farming)’ 데이터를 통해 농민에게 탄소 크레딧을 지급하는 새로운 생태 경제 모델을 구축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