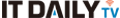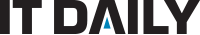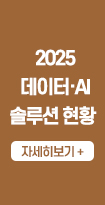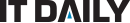텐센트,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 중국 빅테크들 앞다퉈 LLM 보델 발표
버터플라이이펙트 등 유망 AI 스타트업도 부지기수 탄생…중국 AI 영향력 확대

[아이티데일리] 중국에서도 거의 무명이었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발표한 AI 모델은 미국의 하이테크 대기업에 버금가는 고급 오픈소스 모델을 경쟁사보다 훨씬 적은 자원으로 개발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과장됐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재 딥시크는 전 세계 사용자들이 접속하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챗GPT를 앞세운 오픈AI나 앤트로픽(Anthropic) 등 대기업이나 AI 칩을 공급하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조차도 딥시크의 성과를 칭찬하고 있다. 한국의 언론과 AI 업계 역시 딥시크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도입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딥시크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있는 유일한 중국의 AI 기업이나 도구는 아니다. 딥시크가 LLM 모델 R1을 발표한 직후 유사한 모델 발표가 쏟아졌다. 주로 중국 빅테크에 의해서였다. 그 이전에도 유사한 발표가 있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텐센트가 개발한 AI 챗봇 위안바오(Yuanbao)는 3월 초 중국 아이폰 앱 다운로드 순위에서 딥시크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이 앱은 텐센트가 자체 개발한 대규모 언어모델(LLM)인 훈위안(Hunyuan)과 딥시크의 AI 모델인 R1을 통합한 것이다.
또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개발한 LLM의 도우바오(Doubao) 파생판은 물리 공간을 분석해 3D 풍경을 생성하는 공간 모델을 구현했다. 또한 알리바바의 LLM인 콰웬(Qwen)」은 회사의 플랫폼상에서 9만이 넘는 기업 사용자를 확보했다고 SCMP가 전했다.
한편 딥시크의 급성장은 중국의 다른 AI 스타트업들의 부상도 촉발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 3월 중국 우한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 버터플라이이펙트(Butterfly Effect)가 '마누스(Manus)'라 불리는 AI 시스템을 선보였다. 이 시스템은 웹을 자율적으로 탐색하고, 아파트를 찾거나, 주식시장을 분석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마누스는 오픈AI의 AI 에이전트 '오퍼레이터'의 경쟁자로 주목받고 있다.
마누스의 데모 동영상은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 잭 도시가 X(옛 트위터)로 공유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뉴스 사이트 디 인포메이션(The Information)은 버터플라이이펙트가 기업가치 평가액 5억 달러로 미국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또 휴머노이드(인형 로봇) 분야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 만리장성을 달리고 산악의 울퉁불퉁한 바위길을 넘어지지 않고 걷는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은 유튜브를 통해 대거 유통됐다. 중국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참여할 정도다. 이는 이미 본지에서도 소개된 바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목표로 지난 2023년 설립된 애지봇(Agibot)은 2020년 화웨이의 고급 인재 모집 프로그램 ‘지니어스 보이’에 고용된 1993년생 연구자 펑즈후이가 창업한 기업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애지봇은 이미 1000개 이상의 AI 기반 2족 보행 로봇을 제조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그 수를 5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이 회사는 또한 4월 초 알파벳의 문샷 사업부인 구글X에서 일하고 있던 뤄 지엔란을 연구개발 책임자로 고용해 주목받았다.
한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중국 진출을 지원한 유명 투자자 리카이푸는 2022년 영일닷AI(01.AI)라는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이 회사는 자체 오픈소스 모델 개발에서 사업을 전환해 딥시크의 AI를 활용해 게임, 법률, 금융 분야 엔터프라이즈 앱을 개발하고 있다. 피치북에 따르면 영일닷AI는 지금까지 2억 달러를 조달했으며, 현재 기업가치 평가액은 1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짧은 시간에 유니콘 기업으로 부상한 것이다.
이 회사는 중국의 AI업계에서 ‘식스·타이거즈’의 일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멀티모달 AI를 개발 하는 미니맥스AI나 모델 개발 기업인 문샷AI와 함께 알리바바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AI의 발전은 미중 관계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스탠포드 대학·인간 중심 AI 연구소(HAI)의 러셀 왈드 소장은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AI의 발전은 대학에서의 학술 연구와 AI 연구의 성과를 대중에 공개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2018년 '2030년까지 AI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목표 달성을 위해 방대한 학술자원을 투입했다. 그 결과, 중국은 현재 세계의 AI 연구의 상당 부분을 생산하고 있따. 2023년에는 세계 전체 AI 관련 특허의 약 70%를 중국이 취득했고, 중국이 발표한 AI 관련 학술 논문이 세계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이 역시 본지에서 자세히 소개했다.
왈드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기로 결정한다면, 중국은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군대까지 결집시킬 수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왈드는 다만, AI 모델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검열이 서방의 사용자들에게는 장벽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 모델을 다운로드받고 앱을 만들 수 있는 오픈소스 방식은 중국 기업들이 전 세계에 기술을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미·중의 기술 생태계는 파편화되었지만, 딥시크의 경공은 중국의 혁신이 AI 분야에서 그 장벽을 돌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전기차와 차세대 배터리,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솔루션, 탄소 제로 기술 등 일부 분야는 중국이 이미 서구보다 앞선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기술 장벽을 높이려는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억제하고 있지만, 중국의 반발과 대응이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